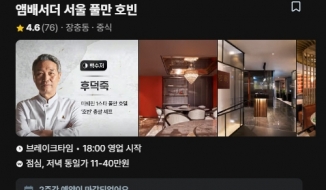현실적 대안은 '민간 소각장' 위탁 뿐
전문가 "주민 반발 이유로 지자체 손 놔"
|
18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 물량은 올해 기준으로 약 51만톤에 이른다. 이 물량 대부분이 당분간 민간 소각시설로 향해야 할 처지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당장 민간소각장이 꼽힌다. 수도권의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마포 소각장 등 공공소각장 건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전국 민간소각시설이 허용 반입량 300만톤 외에 130%까지 추가 처리(최대 390만톤)가 가능하다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소각장 설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반대로 설립할 수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소각장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계약 방안을 모색한다면 생활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서울 지자체들과 3년 장기계약 체결 시 평균 처리단가가 톤당 14만4000원에서 15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입총량제를 초과한 수도권매립지 매립 단가(톤당 15만원)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민간 처리는 소각재 처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지자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산업폐기물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같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 상황을 보면 대부분 한달 내에 민간소각장 등과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일부 지자체는 혹시라도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인지 4자 협의체 등에서 더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쓰레기 대란에 따른 '풍선효과'로 처리 단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담합의 징후가 보인다면 정부에선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영리 추구 목적인 민간시설에 의존할 경우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박정임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민간소각장이 공공 처리를 우선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수용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쓰레기를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식의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는 "애초에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무리하게 제도가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건데, 수용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안 마련 없이 유예해달라고 했던 지자체도 문제가 많다"며 "차라리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면서도 부과금 등 그동안에 방만하게 이 문제를 대응해왔던 지자체도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