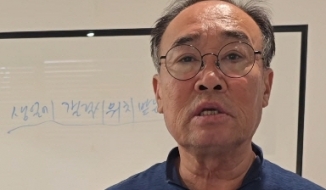|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조사됐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 마련(54.4%)'이 가장 압도적이었다.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해소(4.0%)' 등 자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계형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꼽았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구 국가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구조가 한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 노인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로 10년 안팎의 소득 공백기가 지적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그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65세로 늦춰지고 있어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소 10년의 보릿고개를 지나야 한다.
보고서는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재정 안정에는 유리해도 당장 고령층에게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강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제도의 모순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령층 고용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일정 소득(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고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다만 보고서는 감액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에 국한돼 전체 노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감액 위험보다 당장 벌어야 하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 7.2%씩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긍정적 장치로 꼽힌다. 건강과 일자리가 받쳐준다면 당장의 소득보다 향후 더 높은 연금을 택해 은퇴를 미루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해외 연구들이 공적연금이 노인의 근로를 줄인다고 평가해온 것과 달리, 최근 한국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 수령 여부가 은퇴 결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