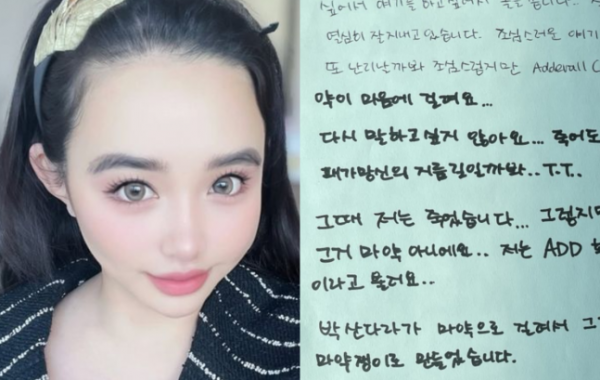내년 예산 교육센터 건립 사업 반영
추가 지원 없인 고사위기 직면 호소
"해외 제조사와 동등한 경쟁은 무리"
|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해상풍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2030년대 초까지 초격차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완료하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2026년 20메가와트(㎿)+급 터빈과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27년 설계를 거쳐 2030년에 터빈 제작과 실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 풍력 시장은 총 1136기가와트(GW) 규모로 성장단계에 진입했으며, 과거 육상풍력 중심이었던 풍력발전이 해상풍력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특별법으로 타워·케이블·하부구조물 등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터빈의 경우 지멘스, 베스타스, GE 등의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터빈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설비 입찰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
2023년 완도금일해상풍력과 신안우이해상풍력 설비 입찰에는 베스타스의 15MW급 터빈이 채택돼 한국남동발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공기업도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한 바 있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 200MW+급 터빈 등 핵심부품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사업분이 반영돼 있다. 문제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제작이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지원 정책이 수립됐다는 입장이지만, 터빈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시장 규모로 인해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GW급 이상을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와 동등하게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전 세계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만 WTO와 FTA를 강조하며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주요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이미 공공 트랙으로 가격 우대 혜택 등을 줬고 터빈 용량도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제품도 외산 제품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베스타스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해상풍력 시장 확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내 공장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민간 부문의 정책 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에도 시장의 안정성을 피력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있는 셈이다.
학계 관계자는 "국산 공급망을 강요하면 PF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외국산과의 경쟁 입찰을 전면 차단할 수 없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