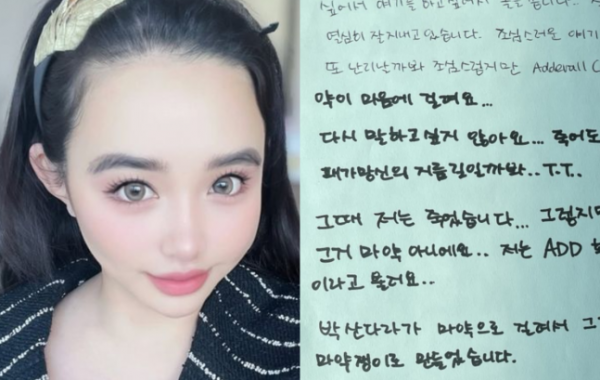|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1월 시행돼 2013년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영업이 제한되는 동안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보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채널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4시간 영업과 배송 시간까지 함께 제한한 점이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기업과 달리 대형마트는 점포 기반 배송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유통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은 제약 없이 성장해 왔다. 쿠팡의 매출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41조2901억원으로 약 3배 늘며 국내 유통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탈할 대체 채널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쿠팡의 대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SSM 등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가 규제로 인해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배송 등 핵심 영역에서 배제되면서 경쟁력 격차가 제도 환경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은 2012년 이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며 온라인 배송 경쟁 자체가 제약돼 왔다. 반면 쿠팡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했고,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오프라인 유통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월 대비 14.1% 하락해, 통계 작성 이후 손꼽히는 감소 폭을 기록했다.
규제의 부작용은 고용과 점포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약 6만2700명이던 대형마트 3사의 근무 인원은 2025년 11월 기준 5만300여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점포 수도 같은 기간 414개에서 392개로 줄었으며, 대형마트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사례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규제만 완화해도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 분포한 대형마트와 SSM 약 1800곳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쿠팡의 물류 캠프에 맞설 수 있는 도심형 배송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서도 새벽배송 허용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110여 개 대형마트와 300여 개 슈퍼를 보유한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위기를 온라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