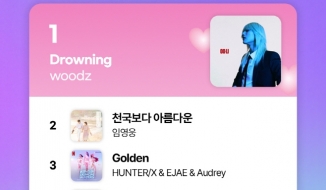최소 수천여 명에서 최대 수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알려진 이 사태가 사반세기가 훨씬 지났건만, 진상 규명 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사태를 여전히 폭동으로 간주한 채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로 털고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당시의 학생 지도자들인 왕단(王丹·51), 우얼카이시(吾爾開希·52), 차이링(柴玲·54) 등은 각각 망명지인 미국과 대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국이 사태의 재평가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체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중국 내의 민주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체제 전복을 위한 지하 조직까지 구축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 대만과 홍콩 등에서 사태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는 것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도발할 경우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하다. 미국은 대중 압박을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톈안먼 사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제는 사태와 관련,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크게 체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의 진실 규명과 사과를 통해 부담을 털고 갈 경우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