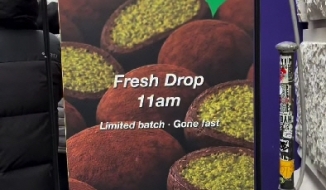|
학문의 영역에서도 직관을 중요하게 여긴 사례는 부지기수다. 뉴턴의 사과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직관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혁명적 사건이었다.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영역에서도 직관의 힘은 중요시되었다. 미술사에서 기존의 도상학을 뛰어넘어 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내재한 의미와 형식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종합적인 미술작품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 방법론이 도상해석학이다. 이를 제창한 학자가 20세기 초 독일의 미술사학에 활력을 불어넣은 엘빈 파노프스키이다. 매우 정교한 학문적 접근임에도 파노프스키는 연구자의 직관을 중요시하였다.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 하나의 점을 간파하는 힘이 직관이라는 것이다.
사진 분야의 연구에서도, 직관과 연관해 중요한 개념을 주창한 이가 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사상가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다. 바르트는 그의 저서 '밝은 방'에서 스투디움과 푼크툼(Studium & Punktum)이란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밝은 방(camera lucida)은 사진에 관한 비평서이다. 비교적 얇은 책임에도 목차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반부는 스투디움과 푼크툼의 상호보완적인 공존한 개념으로 규정했지만, 책의 후반부는 이를 다시 부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기부정의 태도를 보인다.
바르트가 말하는 스투디움은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상징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모성(母城)과 같이 보편적인 정서를 말하며 문화에 따라 공유되는 의미는 달라진다. 반면 푼크툼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스투디움과는 달리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푼크툼에 대한 밝은 방 1부의 태도이다. 책의 2부에서 바르트는 한 개인이 사진을 보고 어떤 요소를 통해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푼크툼은 사진을 보는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파고 들어가며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세계가 열려 사진을 바라보는 개인에게 성큼 다가서는 '찌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직관과도 같은 찌름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우주가 스스로를 열어 그 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직관 역시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직관과 연동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깨달음이 없는 수행은 무의미함을 주장한 이 사상은 사실 돈오(頓悟)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수행(修行)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현실 세계에서 해탈한 자는 없다. 깨달은 자는 세속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속이라는 매개된 모든 것의 부질없음을 직관한 이들은 이미 피안(彼岸)의 세계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는 사건을 배당받은 유능한 프로파일러(profiler)라면 당연히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몰입한다. 범인이 누구인지 정해놓고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개된 사유 방식의 고리를 끊고, 온전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율사(律士)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매개 없이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을 율사가 직관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매트릭스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직관이 허락된 영역은 학문과 종교다. 직관적 사고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의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관력은 당연히 소양이다. 종교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궁극의 피안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 있다.
지난 일 년간, 직관이 필요 없는, 아니 작동해서는 안 되는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너무도 많은 직관적인 행보가 횡행했다. 뭔 말인지 직관력이 필요치 않을 듯싶다. 다만 시민들이 직시(直視)하고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할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떠오르는 단상을 적어본다.
/이황석 문화평론가·한림대 교수(영화영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