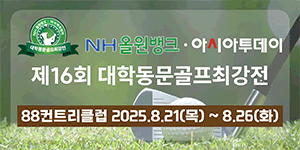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의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달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공식화되는 미국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세션에 15분만 참석하고 떠났다. 시진핑 주석 대신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국을 공격하는 데 급급했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도 배기가스 저감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인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 감축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은 적극적인 기후행동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개도국들도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는 사이 지구 온난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했고, 금세기말 3.4℃나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전세계 연간 배출량은 100년 전보다 18배나 증가했고, 지구 전체의 평균농도가 올해 말 410PPM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회의(IPCC)’에서 ‘1.5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기후위기 상황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기금(GCF) 공여를 두 배로 늘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 등을 제안했지만,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탄소배출의 70%는 12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 6위가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작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사우디·미국·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고, 국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이미 지구 평균을 웃돌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기후행동대책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높은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할 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3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산업·건물·수송 등 4대 배출원에서 91%를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고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나마 감축여력이 있는 건물·수송 등에서 더 많은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에너지 사용행태를 바꿀 수 있다. 지키지도 못할 숫자보다는 가정·상가·지자체 등 각 에너지소비 주체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