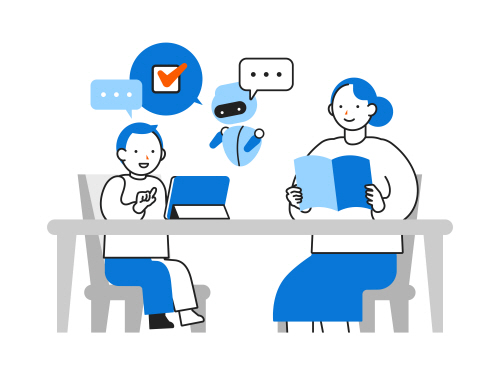|
|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AI 기반 부정행위 논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그 단적인 사례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는 과제·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AI 작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학사관리의 근간이 흔들렸다. AI가 만든 글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의 기준'조차 모호해졌다. 이는 기술의 문제 이전에, 제도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혼란이다.
비슷한 고민은 채용시장에서도 터져 나왔다. AI 면접과 알고리즘 기반 서류평가가 확산되면서 "기계가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AI만 앞세운 결과다.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AI는 교육·채용뿐 아니라 의료 판단, 금융 리스크 평가, 사회복지 적용 등 고도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수록 "누가 책임지는가",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발생하는 논란은 미래의 더 큰 충돌을 예고하는 전조일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기술 속도에 맞는 사회적 안전장치, 즉 제도적 관리다. AI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기술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I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책임성·검증 절차를 사회적 규범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재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용된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필수적이다.
AI 시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갈등이기도 하다. 기술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을 따라가는 사회'가 아니라, '기술을 제도적으로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