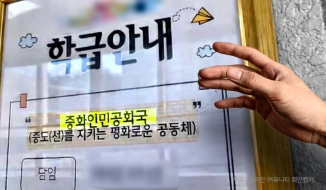|
시칠리아는 지중해의 중앙부에 위치한데다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어서 예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혔고, 지배세력이 숱하게 바뀌어 온 지역이다. 시칠리아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배경이 된 섬이기도 한데, 시칠리아는 그리스와 카르타고, 로마, 게르만, 비잔틴(동로마)과 아랍, 노르만과 스페인 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세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역사와 풍요로운 인문자산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문명의 세례를 받은 이종교배의 산물이 시칠리아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아닌 듯한 다층적인 문화야말로 시칠리아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최근 열흘간 이곳을 여행하면서 느낀 소감은 시칠리아의 '모든 것들은 마치 인간의 눈과 정신, 상상력을 유혹하려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모파상의 찬사대로였다.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영화 '시네마 천국,' '말레나'를 비롯해 '대부(代父)'의 촬영지에다, 요리,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들, 관광지 및 휴양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농업과 관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가장 가난한 나폴리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가져 연중 온난하고 강수량은 고른 데다 화산 지형 덕분에 땅까지 비옥한 시칠리아는 농사가 매우 잘되어 시칠리아의 농산물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편이다. 파스타의 발상지답게 밀은 물론, 속이 빨간 블러드 오렌지(Blood Orange), 피스타치오, 레몬, 올리브, 천일염, 토마토, 아몬드, 포도 등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웬만한 식재료는 모두 풍성하게 난다. '지중해의 식량창고'란 별칭이 붙은 이유다.
로마 제국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시칠리아인들은 자부심이 강하다.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인이 도래한 뒤, 시칠리아 서부는 카르타고, 동부는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할거한 상태로 이들 사이에 근 200년에 걸쳐 시칠리아 전쟁이 7차례 벌어졌으며, 이는 피로스 전쟁을 거쳐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241),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202)으로 이어진다. 당시 시라쿠사, 메사나 등 폴리스(polis, 도시국가)가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지배권을 놓고 국가의 명운을 건 승부를 벌인다. 이른바 3차에 걸친 포에니전쟁이다. 세계역사를 바꿔놓는 전쟁이었다. 반도국가에 머물러 있던 로마는 이 전쟁의 승리로 대로마제국 건설의 발판을 마련한다. 시칠리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고대 로마의 속주가 되어 이후 '로마의 곡창(穀倉)'으로 번영했다.
역사의 가정이긴 하나 만약 지중해에 보석 같은 시칠리아가 없었다면 그토록 죽기 살기로 싸웠을까 하는 생각을 시칠리아를 여행하면서 해보았다. 시칠리아의 역사를 훑어보면 파란만장 그 자체다. 그리스 폴리스기(B.C 8세기)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공화국(1946~현재)에 이르기까지 굽이굽이 굴곡진 역사다. 특기할 점은 역사상 한 번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 스스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위의 강대국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다가 여차하면 들이닥쳐 갖은 수탈과 전횡을 일삼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진 문물과 문명을 전파, 한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기도 했지만, 가혹한 세금 등 피해가 혹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원의 저주(역설)인 셈이다. 시칠리아는 이처럼 만성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외부 세력들의 지배하에 놓였는데, 이들 외세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노린 이유는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자원 때문이었다. 만약 이 지역이 불모지였다면 이렇게 많은 정복자들을 유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시칠리아는 풍요로운 자원과 축복받은 기후를 가진, '천국(Paradise)'에 비유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외세'의 지배하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들이 남긴 부(負)의 유산을 대물림하면서 점차 피폐해졌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비운을 선택하거나 비운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 비운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비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일까. 시칠리아는 지역 사람들끼리만 믿고 통하는 문화로 유명하다. '우리끼리' 정서가 수배 중인 마피아 거물을 보호해주는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같은 이탈리아인이라도 시칠리아 출신이 아닐 경우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팔레르모에 머물수록 실감하지만, '시칠리아 우리끼리' 의식이 존재하는 한 마피아도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멀고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발등의 불 같은 스토리일지 모른다.
이번 시칠리아 여행의 최대 수확은 풍요롭지만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변 세력의 각축장이 되기 좋은 무대라는 사실이었다. 한 나라나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그곳의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 요소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는 이웃 강국들과의 엄혹한 역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국제관계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지도층의 역사 인식과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
비옥한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 풍요로운 물산과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시칠리아. 그러나 그들이 겪은 기나긴 고통과 질곡의 역사. 시칠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 가볍지 않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류석호 칼럼니스트, 전 조선일보 영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