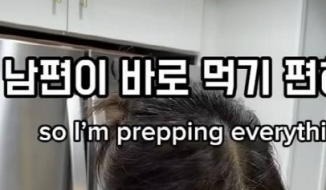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
양사는 지난 6일 삼진제약이 보유한 자사주 40만주(주당 1만9700원), 일성아이에스가 가진 34만6374주(주당 2만2750원)를 블록딜 방식으로 상호 처분했습니다. 삼진제약이 밝힌 처분상대방 선정 이유는 '유통 및 제품 생산 등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협력 강화'입니다. 실제 두 회사는 2023년 고혈압 치료제 코프로모션 협약을 맺는 등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사주 맞교환은 구체적인 사업 협력보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응과 지분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권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진제약은 과거에도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하나제약이 삼진제약의 최대주주 등극을 노리자, 아리바이오와 300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맞교환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근 자사주 처분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돼 온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공시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꼼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광동제약은 지난달 자사주를 담보로 25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공시했으나 허위 기재 등을 문제로 금감원에게 정정명령을 받고 결국 발행을 취소했습니다.
금감원 조치 후 EB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자사주 맞교환'은 얼마 남지 않은 카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소각은 손해라는 인식에 자사주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우호 세력과 상호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맞교환 역시 정부가 의도한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처분 방식입니다. 자사주 맞교환으로 대상 기업이 보유 주식 만큼 의결권과 배당권을 획득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회피 전략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