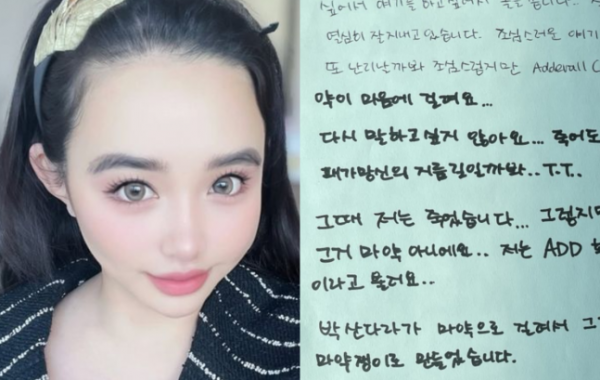|
고3 수험생은 아니지만 늦은 밤 공부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다.
한때 멈췄던 배움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야학을 찾은 늦깎이 학생들이다.
학창 시절이 다시 재생되는 야학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해가 진 오후 하교 후 불이 꺼진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금호초 지척에 위치한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교실은 밤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13일 책가방을 멘 학생들을 따라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샛별학교'를 방문했다.
오후 7시. 강의실 뒤편은 내버려둔 채 12명이 학생이 앉은 책상이 교탁 근처로 가까이 당겨져 있다.
고등 영어 수업이 열리는 목요일 1교시마다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영어 단어와 문장을 직접 발음해 보는 등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많은 수업이기 때문이다. "ice(얼음)!" 선생님을 따라 단어를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강의실의 학생 12명 중 1명의 남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학생인 것이 눈에 띄었다.
과거 남성보다 여성이 배움에 기회에서 배제된 사례가 많아서다. 5년째 운영하는 서울샛별학교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다. 조수현(23) 서울샛별학교 설립자 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 여성들은 배움보다 가족의 식사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큰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미정(가명 65) 씨는 몇 년째 매일 학교에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집에는 비밀로 한 채 하교할 때면 항상 책을 숨긴다. 그는 자녀에게 학력과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남편에게는 무시당하기 싫어 여전히 매일 등교하는 것을 비밀로 한다.
수업 내내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중등 수업 소리가 벽 너머로 들리기도 했다. 서울샛별학교에서는 '목소리'가 수업의 핵심이다. 선생님들이 목 아플 정도로 크게 말해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칠판 위 큰 글씨와 더불어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해야 학생들이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있다.
"I ate a slice of pineapple(나는 파인애플 한 조각을 먹었다)." 오늘 배웠던 마지막 문장을 모두가 읽자 50분간의 수업이 끝났다. 다음 수업 전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몇몇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펜으로 써가며 복습하고 있었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10분간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도 있었다.
함형복(64) 씨는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서울샛별학교는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일반 학교처럼 입학식·졸업식 등 주요 행사도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
조 대표는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결코 배우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좋아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고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60대 학생도 있다.
부동산업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김철진 (가명·66) 씨는 부동산학과에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는 3년간 입시 준비를 하며 실패를 맛보다. 결국 올해 원하던 대학의 부동산학과 입학에 성공했다.
조 대표이사는 "수시 응시부터 면접까지 함께한 기억이 난다. 학력이 꼭 필요한 나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가져온 꿈을 위해 다들 누구보다 노력하신다"고 강조했다.
"어머님!" "어머! 선생님!"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하던 조 대표이사와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야학은 단순히 검정고시 합격을 넘어 청년과 노인이 사제관계로 만나 서로 공존하는 장소였다.
조 대표는 "청년과 노인이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야학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노인들에게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