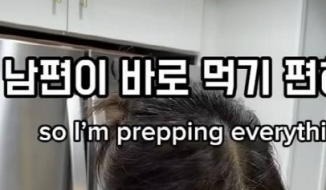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
정부가 추진하는 대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이라기보다, 기존 에너지 생태계를 뒤흔드는 수준의 '급진적 확장'이다. 2035년까지 10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선언 뒤에는 에너지 업계의 실질적인 부담이 존재재한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절반이라도 달성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을 하기엔, 에너지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실체이자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 수준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은 현장의 한계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6% 수준이다. 원자력(31.7%), 액화천연가스(LNG, 28.1%), 석탄(28.1%)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2020년 6.6%에서 4년 만에 4%포인트가 상승한 성장세는 고무적이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1%포인트씩 높여 잡는 현 추세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단순히 자본을 투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민국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다. 우리 전력망은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 생산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에 비해, 현재의 전력 계통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적기에 송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빈번한 '출력 제한(감발)'과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 계통 붕괴를 막아주는 '무효전력' 공급 능력은 재생에너지가 갖추지 못한 치명적 약점이다. 이는 결국 원전과 LNG 발전 같은 전통적 회전 기기 기반의 에너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우리가 장기간 쌓아온 에너지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원전·LNG 발전의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위험한 이유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계된 정책은 반드시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송·변전 시스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전국 단위의 전력망에 이를 전면 적용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만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절대적 열쇠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GW'라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원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