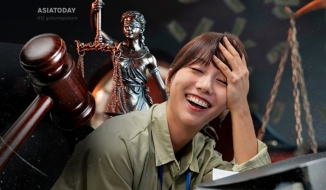카카오게임즈·펄어비스 나란히 4위·5위 등극
|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종목 가운데 바이오 업종은 단 6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까지만 해도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총 20위 기업의 절반가량인 9곳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 달 만에 3개 기업(한국비엔씨, 유바이오로직스, 오스템임플란트)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제약·관련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상위 업종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빈집 채우는 ‘미디어·게임’ 콘텐츠주
최근 코스닥 시장엔 제약·바이오주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미디어·게임 등 콘텐츠 기업들이 새롭게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인기가 커졌다. 또 국내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K-콘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관련주로 분류만 되어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지각 변동의 원인 중 하나다. 게임주인 위메이드의 폭발적인 성장세만 봐도 알 수 있다. 위메이드는 한 달(10월 1일 기준) 전 까지만 해도 시총 20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지만, 지난 8월 자사 게임 ‘미르4’를 글로벌 버전으로 재출시한 후 단숨에 코스닥 6위 기업으로 뛰어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시총 역시 1조3742억원에서 6조102억원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위메이드가 미르4에 블록체인 경제를 접목해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벌 수 있게 한 것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줬다. 게임주이면서 동시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도 한 달새 시총이 4조8396억원에서 6조5650억원으로 급증하며 순위 역시 3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넵튠,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펄어비스도 시총이 5조6486억원에서 7조2313억원까지 불어나며 코스닥 3위 자리를 꿰찼다. 펄어비스는 오는 12월 중국에 출시될 검은사막 모바일을 앞두고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 증권가에선 흥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도 정통 코어 MMORPG 신작이 없었기에 신작에 대한 인기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다양화…증권가 “긍정적 변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시총은 12조8045억원으로 한 달새 3조2554억원가량 날라갔다. 셀트리온제약도 5조1167억원에서 4조2396억원으로 쪼그라 들면서 순위가 두 계단이나 밀려났다.
증권업계에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세대교체를 두고 ‘미래 성장 산업의 다양화’ 현상으로 긍정 해석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근 게임, 2차 전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테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총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업종이 올라가 있는 것이 코스닥 성장에 있어서도 좋다. 업종이 한 쪽으로 쏠려 있으면 산업의 개별 악재에도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